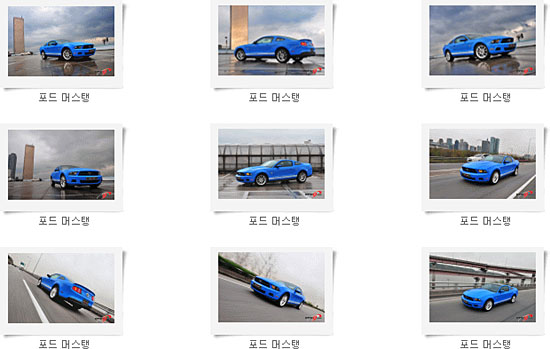900만대가 팔린 국민 스포츠 쿠페
가격 대비 최고의 자세는 바로 포드 머스탱이다. 그만큼 디자인을 잘 뽑았다. 이 정도 자세를 다른 차에서 얻기 위해서는 돈을 한참 써야 한다. 아니, 다수의 민간인(?)들에게는 그 좋다는 유럽차보다 더 먹힐 수 있다. 그런데 머스탱은 단돈 3,900만원이다. 이건 매직에 가깝다. 600만원만 더 써 봐라. 이 자세에 뚜껑도 열린다. 다만, 성능과 연비가 매우 중요하면 패스해야 한다.
글/ 한상기 (rpm9.com 객원기자)
사진/ 박기돈 (rpm9.com 팀장)
머스탱이 작년 역대 최저 수준의 판매고(6만 7천대)를 기록하긴 했지만 여전히 막강한 이름인 것은 분명하다. 국내에서는 참 만나기도 힘들고 타보기도 힘들지만 미국에서는 국민 스포츠 쿠페이다. 1964년에 데뷔해 현재까지 900만대 이상이 팔렸다. 앞으로 2도어 모델로서 머스탱보다 많이 팔리는 차가 나오긴 어려울 듯싶다.
머스탱은 코베트와 함께 미국 스포츠카의 아이콘이다. 머스탱 부품 재고가 향후 50년치가 있다는 말도 들은 것 같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만큼 미국에서는 머스탱의 존재가 확실하다. 그리고 포드에게도 중요하다. 포드의 미국 판매가 죽을 쑬 때도 머스탱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 쿠페 시장에서는 언제나 1위를 달렸다. 이제야 카마로가 신형이 나오면서 경쟁이 되는 정도다.
놀랍게도 머스탱은 구식 기술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리어 액슬에 일체식 서스펜션이다. 요즘은 일체식을 쓰는 건 참 드문데,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개념은 좀 다르지만 포르쉐 911 같은 구석이 있다. 이런 느낌을 여전히 원하는 팬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다. 2005년부터는 V6 엔진이 SOHC로 바뀌긴 했지만 한참 동안이나OHV 방식을 고수했었다.거기다 세련된 직분사 엔진의 카마로가 덤비니 2011년형부터는 V6도 DOHC로 바꿔버렸다. 시승차는 2010년형이다.
이전의 머스탱 V6는 관심 밖이었다. 리터당 50마력 나오는 엔진인데다 스타일도 그저 그랬다. 구식 냄새가 물씬했다. 그런데 2005년에 나온 현행 모델은 분명 과거의 디자인을 재해석한 것인데 대단히 멋지다. 제대로 근육질의 디자인으로 다시 나타났다.
사실 레트로 디자인이 탐탁치는 않다. 꼭 더 이상 새 것을 만들기 힘들어 과거에 기대는 느낌이 나서다. 하지만 머스탱 정도로만 디자인을 뽑는다면 대환영이다. 힘찬 직선과 곡선이 만들어 내는 스타일은 당장이라도 뒷바퀴를 태워버릴 것만 같다.
머스탱은 조랑말로 시작했지만 곧 머슬카로 변신했다. 지금의 디자인은 60년대 후반의 모델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인데, 머스탱이 가장 출력이 높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은 그때처럼 대배기량 엔진을 얹을 수는 없지만 스타일링만큼은 과거의 전성 시절을 재현해 내고 있다. 앞뒤에 붙은 특유의 머스탱 엠블렘의 모양이 다른 것도 눈에 띈다. 트렁크에 붙은 엠블렘은 머스탱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사이즈도 크다.
2010년형 머스탱은 부분 변경 되면서 곡선이 더해졌다. 각 보디 패널은 약간의 곡선이 더해지면서 보다 풍만해졌고 보닛도 더 돌출됐다. 보닛의 튀어나온 부분에 커다란 램 에어라도 달면 더 과격해질 것이다. 앞뒤 램프의 모양도 달라졌다. 후방의 디자인은 과거의 패스트백의 느낌이 나기에는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앞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타이어는 235/50R/18 사이즈의 피렐리 P-제로 네로이다. 미국차, 특히 미국 회사의 자동차에 피렐리 타이어가 달리는 경우는 많이 못 본거 같다. P-제로 네로는 직빨 위주 세팅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머스탱의 성격에 변화를 준 것일 수도 있다.
외관을 보면 차에 타자마자 당장 달려야 하겠지만 일단 실내를 둘러보았다. 과거에 비하면 실내가 꽤 좋아졌다. 우선 대시보드 등의 플라스틱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새 열가소성 플라스틱이 적용되면서 실내의 느낌 자체가 달라졌다. 이전의 딱딱함만 생각하다가 한 방 먹은 느낌이다.
머스탱의 실내는 은근히 고급스럽다. 시트만 해도 가죽의 질이 괜찮다. 보기에도 스포티하지만 몸에 달라붙는 느낌이 좋다. 거기다 굵은 주름도 들어갔다. 시트는 슬라이딩과 요추는 전동인데 등받이는 수동으로 조절한다. 등받이 각도는 수동으로 세밀하게 조절하란 배려일 수도 있다.
센터페시아는 간단한 디자인인데 은근히 기능은 많다. 상단에 모니터가 있고 그 아래로 오디오와 공조 장치 패널이 배치된 디자인이다. 작동은 모두 터치스크린이고 한글이 지원되지 않아 한눈에 쏙 들어오지는 않는다.
메뉴에서 피드백 세팅으로 들어가면 터치스크린 동작음과 보이스 볼륨을 세팅할 수 있고 음성 인식의 반응 모드도 스탠다드와 어드밴스 2가지가 제공된다. 시스템 세팅에는 키보드 레이아웃도 ABC와 쿼티(qwerty)를 고를 수 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가도 바람 세기와 온도 조절 버튼을 누르면 바로 공조 장치 화면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다시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빠르다. 바람의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CLIMATE`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야 하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다. 후방 카메라도 있는 건 기대치 못한 보너스이다.
다른 기능과 달리 내비게이션은 한글화가 완벽하다. 시동을 켤 때마다 미국 내비게이션이 뜨기 때문에 NAV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게 좀 귀찮긴 하지만 맵 화질도 좋고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시동을 끄고 키를 뽑아도 모니터와 라디오가 유지되는 것도 흥미롭다. 첨에는 혹시 방전될까바 약간 불안하기도 했지만 키를 뽑고 문을 열면 모니터와 라디오가 꺼진다.
모니터 상단의 송풍구 사이에 시거잭이 있는 건 좀 뜬금없는 디자인이다. 보통은 여기에 시계가 있어야 어울리는 자리인데 시거잭이 있다. 뒤로 크게 열리는 센터 콘솔 박스를 열면 USB와 시거잭이 또 있다.
가죽과 금속이 어우러진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머스탱의 외관만큼이나 클래식한 디자인이다. 쿠페로서는 조금 운전대가 커 보이지만 미국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스포크에 적용된 금속은 조금 차갑다. 겨울철 아침에는 꽤 차갑겠다는 괜한 걱정도 생긴다. 스포크에는 오디오와 음성 인식,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마련된다. 시프트 패들...이런 거 없다.
클래식한 일자형 기어 레버를 보고 시프트 패들에 대한 기대는 진작 접었다. 두툼한 기어 레버는 수동 모드도 없다. 요즘 차로서 수동 모드 없는 자동은 정말 드물다. 클래식한 오버드라이브 버튼만 있을 뿐이다.
머스탱 실내의 테마는 조명이고 그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 바로 계기판이다. 계기판 역시도 디자인이 클래식한데 조명은 아주 세련됐다. 계기판 조명은 기본적으로 7가지가 내장되고 테두리 주변의 색상도 선택이 가능하다. 즉 운전자 취향대로 계기판 조명 색상을 조합할 수가 있다. 타코미터의 바늘이 레드 존을 때리면 계기판 조명도 번쩍거린다. 운전대 옆의 인포, 셋업으로 들어가면 실시간 연비와 마이 컬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머스탱 V6는 엔진의 음색도 다르다. 둥둥 거리는 베이스 음은 톤이 낮고 빠르며 밑으로 울려 퍼진다. 베이스 톤의 엔진 음색은 많지만 머스탱 V6의 사운드는 조금 궤를 달리 한다. 리터당 50마력이 조금 넘는 출력은 완전 평균 이하다. 요즘 리터당 50마력짜리 엔진은 없다. 물론 수치로만 평가할 것은 아니다. 수치로 보이지 않는 감성적인 면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미제 엔진은 방식과 상관없이 저속 토크가 좋다.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대체로 그랬다. 머스탱 V6는 그런 성격이 더욱 강조된다. 가속 페달을 살짝 건드리면 툭 하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저속, 저회전에서는 반응이 아주 빠른 셈이다. 외모는 타이어를 금방이라도 불태울 것 같지만 아쉽게도 그 정도의 출력은 아니다.
엔진은 중저속 토크 위주이다. 100km/h까지는 만만치 않은 순발력을 발휘한다. 체감 가속력도 빠르다. 으르렁 대는 엔진 소리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다. 거기다 가속 시 차체의 앞뒤 움직임이 큰 편이어서 ‘달려나간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다.
4천 rpm 이상이 되면 엔진은 힘이 빠지고 변속 되는 시점에서는 토크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레드 존을 치면 계기판의 조명이 번쩍 거리면서 긴장감이 생기는데, 그와 반대로 엔진이 내는 고회전 파워는 미미하다. 보통의 DOHC 엔진은 고회전에서 출력이 나오면서 기민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머스탱 V6는 그런 특성과는 사뭇 다르다. 일반적인 속도 제한 이하의 속도에서 재미있는 가속을 즐기는 타입이다.
1~3단에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는 60, 100, 145km/h이고 4단으로 넘어가면 가속력이 처지기 시작한다. 시승차는 185km/h에서 속도 제한이 걸린다. 이 이상의 속도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기세로 보아서는 너끈히 ‘200’을 넘는다고 장담할 순 없겠다.
앞서 말했듯이 5단 자동은 일자형 기어 레버에 수동 모드도 없다. 오버드라이브만 있다. 그래서 차라리 속 편하다. 운전대 두 손으로 꼭 잡고 앞만 보고 달리면 된다. 괜히 수동 모드니 뭐니 신경 쓸 이유가 없어 운전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다.
머스탱은 여전히 리어 서스펜션에 일체식 라이브 액슬을 쓰고 있다. 그런데, 그런 선입견만 없으면 하체의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다. 오히려 뒷바퀴굴림 특유의 운전 재미를 잘 살리고 있다. 사실 시승차 외에 머스탱을 타본 것은 2003년의 SVT 버전 뿐이었다. 당시의 SVT는 고성능 버전이라는 성격이 무색하게 하체가 대단히 물렁했고 롤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의 머스탱 V6는 이전의 SVT보다도 하체의 성능이 훨씬 좋다. 우선단단해지기도 했지만 움직임 자체가 세련됐다. 대책 없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일이 없다. 코너를 돌 때 의외로 언더스티어도 안 난다. 머리가 안으로 사악 감기는 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 같다. 코너링 속도가 빠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재미 자체는 좋다.
브레이크는 꽂히듯 선다고 할 순 없지만 준수한 성능이고 좌우 밸런스도 좋다. 페달을 터치하면 약간의 지체 후에 강한 제동력이 나온다. 몇 번의 급제동 이후에도 페이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머스탱 V6는 빨리 달릴 필요가 없다. 각 잡고 천천히만 다녀도 알아서 1등으로 쳐 준다. 가격 대비 자세에서 이만한 차가 없다. 달리면 기름도 많이 먹고 생긴 것만큼 나가지 않는데 굳이 빨리 달릴 이유가 별로 없다.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는 글래스 루프 밖의 풍경을 즐기는 게 최고다.
외모만 보고 사귈 수 있을까? 이건 두말 하면 호흡곤란인 질문이다. 예쁘고 잘생기면 장땡이다. 죽도록 같이 살 거 아니면 말이다. 자동차로 치면 머스탱이 바로 그렇다. 외모가 중요하고 자세(일명 폼)잡기 좋은 차를 찾는다면 그 답이 바로 머스탱이다.
© 2025 rpm9.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